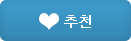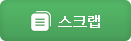카툰/팬아트/소설
 Xro Xro |
날짜 : 2017-11-15 07:20 | 조회 : 1606 / 추천 : 54 |
|---|---|---|
[소설] 징징글졸업반이 되었다. 날씨는 추워지는데 졸업 논문은 마무리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게임을 잠깐이라도 그만 둬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지나갔다. 그 생각은 오래 가지는 않았다. 이제는 직업으로 삼기로 한 게임이다. 내 적성에 맞지 않는 논문보다야, 인생을 생각하면 게임이 먼저다. 눈이 시리도록 파란 모니터에는 국산 게임 몇개와 해외 게임 몇개가 힘없이 흩어져 있다. 그 주변을 무수히 많은 한글 파일과 PDF 파일들이 덮고 있었다. 물 속에 게임이 잠겨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숨을 멈추고, 이내 힘이 빠져 저 너머로 가라앉고 있었다. 하지 않는 게임들을 조금 정리해볼까 생각해서, 제어판을 켰다. 마지막 사용일자 순으로 정렬하자마자 던전앤파이터가 대차게 치고 올라왔다. 다른 게임에 비해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압도적이다. 내가 왜 여태까지 이걸 지우지 않았지? 손톱을 물어 뜯으며 커서를 가져다 대었다. 선뜻 눌리지는 않았다. 내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던 게임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던 철부지는 그저 공부가 하기 싫어서 게임을 켰다.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어떻게 재미있는 게임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학원에 가야한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다는 사실만이 내 뇌리에 남았다. 그게 컴퓨터 게임이었다. 던파라는 게임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화려한 게임도 아니고, 쉬운 게임도 아닌데 재밌다고 했다. 나는 그렇게 파도에 휩쓸리듯 인기에 편승했다. 시작은 그랬다. 첫 캐릭터로는 거너를 골랐다. 귀검사는 키가 작았고, 격투가는 성에 차지 않았다. 거너는 길쭉길쭉했고, 멋있었고, 알게 모르게 중학생 감성을 자극하는 구석이 있었다. 던전앤파이터에 몰입한 건 순식간이었는데, 그래서 자세한 기억은 없다. 단편적인 기억들만이 깨진 거울조각처럼 흩어져있을 뿐이다. 엘븐 가든의 수많은 유저들, 하나같이 칸나의 노예를 달고 있던 그 유저들은 우습기도 했지만 어린 나를 압도하기도 했다. 로리엔 안쪽의 보물상자에서 튀어나온 중검을 30만 골드에 팔아넘기고 기쁨에 가득찬 나머지 장비를 전부 중갑으로 샀다가 캐릭터가 너무 느려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었다. 그런 식으로, 내 기억은 조각조각 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의 던파를 추억으로 묶어내는 것들은 어떤 매개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고도 나를 감싸덮는 그 어떤 분위기였다. 나는 엘븐 가드의 냄새를 기억한다. 비노슈와 케라하가 자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엔 또 얼마나 짜릿했던가. 악명높은 프로스트 머크우드는 뼈가 시리도록 차가웠고, 불타는 그락카락은 그야말로 초열지옥같았다. 엘븐 가드의 이끼와 나무들이 내는 습한 공기, 그 느낌, 헨돈 마이어의 건조하면서도 몸이 녹는 듯한 공기같은 것들이 내 기억을 추억으로 묶어낸다. 그러한 '감각'들은 죽어가던 내 상상력을 자극했다. 소설 창작 과제(그 시절엔 숙제라는 표현이 더 맞겠다)를 계기로 한글문서를 켰다. 케라하는 왜 그토록 추운 곳에 갇히게 되었을까? 그 케라하를 찾아가는 모험가들은 무슨 이유에서 그녀를 죽여야만 했을까? 소설의 시작은 그 지점에서부터였다. 그 시절의 나는 던전앤파이터라는 가상의 공간에 실재했고, 실재의 나는 곧 가상의 나였으며, 캐릭터가 느끼는 것을 내가 느꼈다. 내 캐릭터의 발길이 닿는 곳에서 피어나는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그걸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또 반응이 좋았다. 나는 신이나서 글을 써댔다. 소설가가 되고 싶어질 정도로. 아귀가 모두 맞아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공식 홈페이지 속 아라드력의 인물들은 살아있었다. 아르덴 회전의 기적과 비극, 카곤과 세리아, 로리안으로 이어지는 묘한 긴장감, 그란디스 그라시아의 오빠를 향한 순애보와 같은 것들은 던전앤파이터를 살아 움직이는 세계로 만들었다. 기자단도 하고, 이계도 돌리고 하는 와중에 수능을 치렀다. 대학에 입학했고 자연스레 게임보다 술을 더 가까이 했다. 글 쓰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동시에 던파에 접속하는게 자연스레 게을러졌다. 첫번째 단절이 그때 찾아와 군 제대까지 이어졌다. 긴 공백이었다. 병장이 되어 싸지방에서 쿠노이치 광고를 보았을 때 난 눈이 휘둥그레해졌다. 그 던파가, 그 습하고 축축한 던파가 이렇게나 변했구나. 쿠노이치는 화려했고, 가벼웠고, 파괴적이었다. 내 추억 속의 던파와 쿠노이치가 마구 충동질했다. 전역모를 쓰고 돌아온 세계에, 상상은 없었다. 어떠한 냄새도 없었고, 단지 달리는 사람들만 있었을 뿐이었다. 세계는 뒤집혀 있었고, 스토리는 몸을 내놓는 척 하며 저 너머 뒤로 숨어버렸다. 아니, 애초에 사람들의 관심은 데이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게임 안에서 냄새를 맡지 않았고, 게임의 온도를 느끼려 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숫자에 집착하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주변을 가려놓은 경주마처럼 달렸다. 사람들은 접속하자마자 세리아를 지나쳐 나갔고, 카곤은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 되어있었으며, 키리와 칸나는 장사치로 전락되어 있었다. 게임의 전반적인 속도가 무척이나 빨랐다. 나는 당황해서 며칠 쿠노이치를 육성하다가 게임을 꺼버렸다. 그러한 기억의 편린들이, 3년간의 공백의 조각들이 제어판 창 안에 녹아들어있었다. 쿠노이치의 시뻘건 선홍빛과 불타는 그락카락의 붉은 빛이 떠올랐다. 그 뿐만 아니라 바뀌어버린 모든 것들의 선명한 색이 눈을 콱 쏘는 기분이었다. 엘븐 가드의 눅눅한 이끼 냄새를 맡고 싶었다. 얼마 전에 오리진 업데이트를 한다는 소식을 보았다. 눈이 아플 정도로 짙푸른, 선명한 초록색이 떠올랐다. 나는 고개를 저었고, 왼쪽 버튼을 눌렀다.
소설이라기보단 산문이네요
|
||
 Xro
Xro 
0

13,060
프로필 숨기기
신고
70%